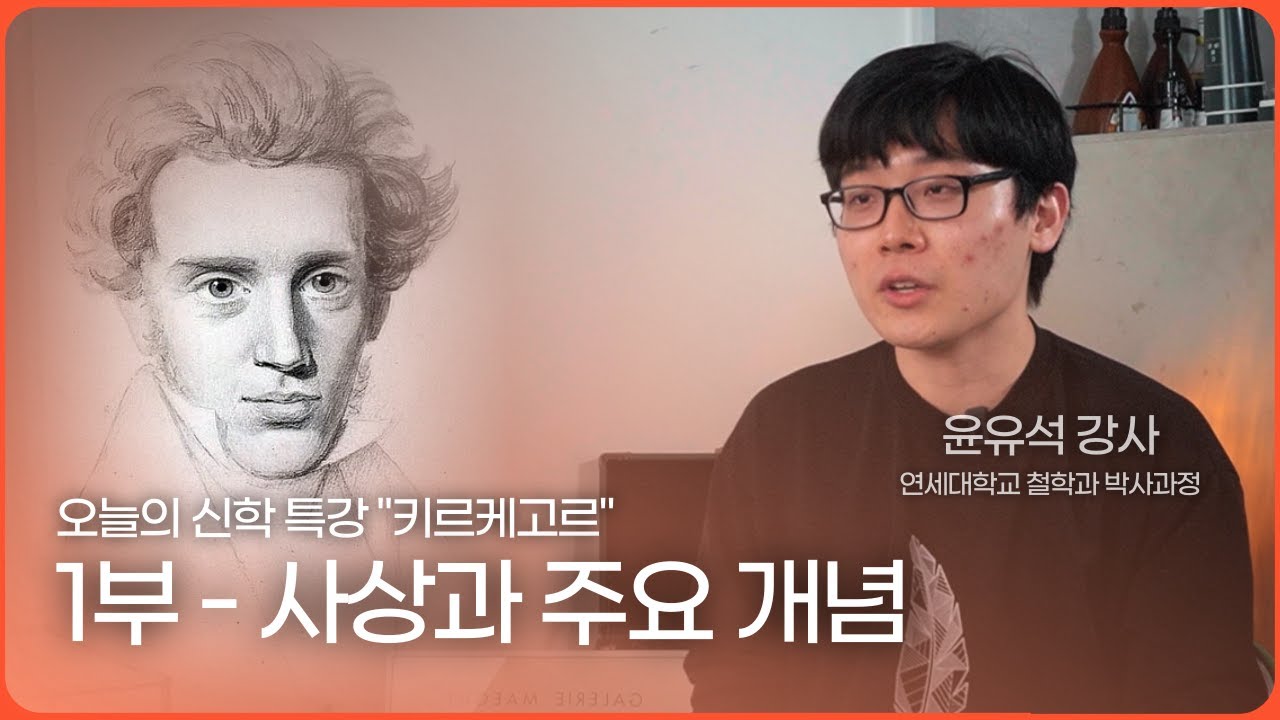- 현재 '삶의 의미'에 관심을 두고 여러 책을 읽어나가는 중인데, 지금은 <죽음에 이르는 병>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앙인이 아니라서 그런가 좀 긴가민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영원성' 과 '변증법적 종합'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죽음을 이르는 병>은 아시다시피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인간은 정신이다. 그런데 정신이란 무엇인가? 정신이란 자기自己다. 그런데 자기란 또 무엇인가? 자기란 자기 자신에 대한 하나의 관계 혹은 그 스스로에게 관계하는 이 관계의 속성이다. 자기란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그 스스로에게 관계하는 관계의 사태이다. 인간이란 무한한 것과 유한한 것의 종합, 시간적인 것과 영원한 것의 종합 그리고 자유와 필연의 종합, 간단히 말해 하나의 종합이다. 종합이란 두 가지 사이의 관계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생각해 볼 때, 인간은 아직 ‘하나의 자기’가 아니다."
쉽게 말해 인간은 두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지만 이 둘을 종합해내지 못했다는 거죠. 여기서 '종합'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헤겔의 변증법에서 비롯된 용어로, '변증법적 종합'이란 어떤 무언가A, 그리고 그 무언가에 반대 되는 무언가 B가 존재한다면 이 둘 중 어느것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둘의좋은(?) 부분을 합쳐 새로운 C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흔히 변증법에 대한 오해라고들 하는 것 같던데 일단 저는 "변증법적"이라고 하면 대충 저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즉 이 논리를 저 문장에 적용하면, 인간은 대립되는 두 측면을 지니고 있지만 둘을 종합해 C에 이르지 못했는데,<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C는 '(두 대립되는 측면을 모두 올바르게(?) 갖춘) 진정한 자기'라는 것이죠.
여기서 첫번째로 이런 변증법에 대한 이해가 맞는 것인지, 키르케고르가 "변증법적" 이라고 하면 대충 저런 의미로 이해하고 가도 되는 것 인지 여쭙고싶네요.
두 번째는 영원성에 대해서 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에는 줄기차게 '영원성'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죠.
다시 <죽병>(다 쓰기 귀찮으니 줄이겠습니다) 첫문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저는
인간은 정신이다. 그런데 정신이란 무엇인가? 정신이란 자기自己다. 그런데 자기란 또 무엇인가? 자기란 자기 자신에 대한 하나의 관계 혹은 그 스스로에게 관계하는 이 관계의 속성이다. 자기란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그 스스로에게 관계하는 관계의 사태이다
이 부분을 "내가 나 자신 스스로에게 관계할 때, 파악하는 나와 파악 당하는 나의 모습, 그리고 그 둘 사이의 관계를 키르케고르는 ‘자기’라고 말한다."고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파악하는 나'는 '나'를 무언가 기존의 자신을 넘어서는, 가능성있는 존재인 '나'를 생각하며 자신을 살펴보지만, '파악당하는 나'는 그런 가능성 있는 존재와는 거리가 멉니다. 이러한 자신에 대한 기대와 실체 사이의 괴리가 절망을 낳는다, 저는 대략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원성'은 가능성 있는 존재인 '나' 에 가깝겠죠. 그런데 저는 왠지 이런 이해가 '영원성', 나아가 키르케고르의 논의에 대한 예시나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계속 드네요.
그래서 저의 이런 이해가 과연 맞는지, 나아가 '영원성'을 정확히 어떻게 이해하는지 좋을지에 대해 조언해 주셨으면 합니다.
- 이건 오랫동안 키르케고르를 알아보며 가져왔던 궁금증인데, 내친김에 여기다도 써봅니다.
현재 정리한 <죽병> 제 1부 3장 2.가능성과 필연성의 규정 하에서 고찰된 절망 에서 키르케고르는 가능성의 결핍이 필연성의 절망을 낳는다 말하며, 이런 절망에서 구원받기 위해선 가능성의 모태(이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인 신을 믿는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신을 믿는,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키르케고르에게 있어 '오성을 포기'하는 것과 같죠. 즉 절망에는 합리나 논리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음을 깨닫고 신앙의 영역에 들어서, 자신의 구원을 신에게 맡기는 것이라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미진한 이해력, 그리고 신앙인이 아니라서 그런지 이 부분이 좀 캥깁니다. 첫번째로는 절망에 벗어나기 위해서 왜 다른 가능성을 추구하지 않고 가능성의 모태인 신을 믿는 것으로 넘어가야 하는지, 두번째로는 오성을 포기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라 볼 수 있는지 입니다.
예를 들어 구원을 위해 신이 부도덕적인 짓을 지시한다면 그대로 따르는것이 옳은 일일까요? 혹은 과정이야 어찌 보이든 신이 부도덕한 짓을 명령할 리 없다고 믿는 게 신앙이라 봐야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