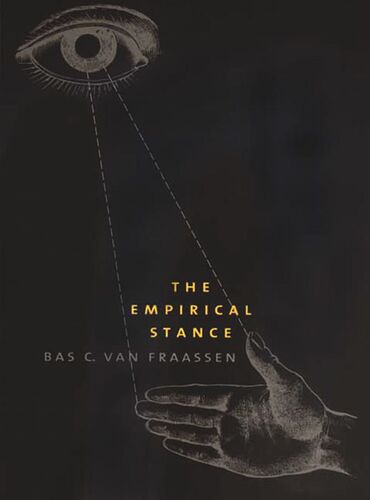반 프라센의 과학철학을 알아보고 싶어서 도서관에서 『경험적 입장』(The Empirical Stance)이라는 책을 대출해서 훑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책의 서두부터가 예사롭지 않더라고요. 과학철학 저서의 시작 부분이 신은 과연 죽었는지,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죽었는지 아니면 "철학자들의 신"이 죽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라서요.
여러분이 이전에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말로 시작하겠습니다.
신은 죽었다.
내가 이것에 대해 진지하다고 생각한다면 맞습니다. 그런데 나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파스칼이 죽었을 때, 그의 코트 안감에서 종이 조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위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요 철학자들의 신이 아니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파스칼은 17세기 데카르트와 동시대인이었고, 데카르트의 『제1철학』에 등장하는 신은 전형적인 철학자들의 신이었습니다. 물론 그는 전지하고, 전능하고, 전능하며, 데카르트가 말하는 모든 것이 사실임을 보장하도록 정확하게 설계되었습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아주 좋은 예를 가까이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신이 죽었다고 말할 때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철학자들의 신은 죽었다.
이 신은 형이상학, 즉 형이상학의 피조물이고 형이상학이 죽었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B. van Fraassen, The Empirical Stanc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2, p. 1. (구글 번역 및 인용자 수정)
그 뒤에도 계속 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책의 앞부분을 다시 살펴보니, 이 책이 '과학과 철학의 관점에서 본 종교에 대한 드와이트 해링턴 테리 재단 강연'(The Dwight Harrington Terry Foundation Lectures on Religion in the Light of Science and Philosophy) 원고를 출판한 것이더라고요.
종교학, 종교철학, 신학 분야에서 '기포드 강연'(Gifford Lectures)이라는 대단히 권위 있는 강연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테리 강연'(Terry Lectures)은 저로서는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강연을 통해 출판된 책들 중에서는 제가 이미 읽어본 익숙한 책들이 많더라고요. 개신교 신학자 폴 틸리히의 『존재의 용기』, 가톨릭 신학자 한스 큉의 『프로이트와 신의 문제』, 분석심리학자 칼 융의 『심리학과 종교』가 모두 테리 강연 원고였다는 것을 이제서야 깨달았네요.
반 프라센이 가톨릭 신앙인인 것도 알고 있었지만, 그동안 저는 반 프라센의 경험주의적 과학철학에만 주목하였다 보니, 종교를 직접 다룬 반 프라센의 글은 처음 읽어 봅니다. 예전에 유튜브에 올라온 반 프라센의 인터뷰 영상을 보면서 이 사람이 종교에도 상당히 관심이 많은 인물이라는 것은 짐작하였지만, 아예 자신의 경험주의의 관점에서 종교를 논의한 책을 쓴 것을 보니 흥미롭네요.
특별히, 반 프라센이 유대교 사상가 마르틴 부버나 개신교 신학자 루돌프 불트만에 대해서까지 책의 한 부분을 할애해서 진지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이 대단히 놀랍네요. 반 프라센의 인터뷰를 보면서 실존주의의 냄새가 많이 난다고 느꼈는데, 확실히 일반적인 영어권 분석철학자들의 지평을 크게 넘어서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게다가, 그 사람들에 대한 반 프라센의 논평도 상당히 깊이가 있습니다. 가령, 대강 훑어 보았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반 프라센은 현대과학에 대한 불트만의 실존주의적 응답이 충분하지는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불트만의 응답이 신앙을 단순히 '철학화' 혹은 '과학화'시키려는 경향에 대한 비판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공정하게 강조하네요. 전문 조직신학자나 종교철학자조차 불트만의 소위 '비신화화(demythologization)' 이론이 단순히 그리스도교를 철학으로 환원시키는 작업이라고 자주 오해하는 것과 비교해 보면, 반 프라센이 상당히 진지하고 깊게 불트만을 읽었다는 것이 보이네요.
"어느 철학과 학생이 나에게 설명해준 것처럼, 때때로 대중적 과학 저술가들은 무엇인가가 충분히 크거나 충분히 작기만 하다면 그것이 삶의 의미와 반드시 관련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간단히 말해, 불트만이 현대의 독특한 (작은) 신화 만들기 형태와 벌이는 싸움입니다." (B. van Fraassen, The Empirical Stanc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2, p. 229.)
그렇지만 이 책이 종교적 주제에만 치중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반 프라센 본인이 왜 오늘날 '분석 형이상학'의 경향에 반대하는지, 그리고 그가 생각하는 '경험주의', '경험', '과학'이란 무엇인지를 평이한 어조로 소개해주고 있네요. 반 프라센의 대표작으로 유명한 『과학적 이미지』(The Scientific Image)보다도 저에게는 훨씬 읽기 쉽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 책을 읽으면서 반 프라센의 과학철학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 보려고요. 철학적 해석학을 전공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하이데거와 가다머의 사유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적어도, 그들의 사유와 정합적일 수 있는) 과학철학적 귀결들을 반 프라센이 아주 잘 집약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 이 사람의 입장을 제대로 파악해 보아야겠다고 항상 다짐했는데, 이번에 발견한 『경험적 입장』이 아주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고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