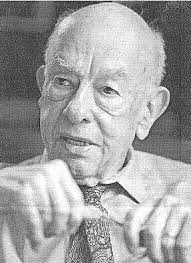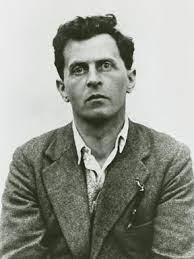요즘 시간이 날 때마다 트리포디의 책을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3장의 내용이 무척 흥미롭네요. (a) 2차대전 이후 1950-60년대 사이에 미국이 세계 경제의 중심지로 부상하면서 철학계의 중심지도 영국에서 미국으로 옮겨갔고, (b) 미국은 유럽에 비해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을 수입하는 데 시간이 걸렸을 뿐만 아니라 유럽과의 언어적-문화적 차이로 인해 비트겐슈타인을 논리실증주의 철학과 뒤섞어서 수입하게 되었는데, (c) 그 과정에서 카르납의 주장들과 비트겐슈타인의 주장들이 미국에서 서로 동일시되어버렸다는 내용이 나오네요. 그리고 (d) 카르납의 의미론적 기획이 굿맨, 타르스키, 콰인 등에 의해 비판의 대상이 됨에 따라 비트겐슈타인도 카르납과 함께 묶여서 비판의 대상으로 취급되었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런 역사를 설명하면서 트리포디가 콰인과 비트겐슈타인의 관계에 대한 흥미로운 일화를 들려주네요. 콰인은 박사학위를 받은 다음 유럽으로 유학을 가는데, 이때 콰인이 비트겐슈타인에게 만나고 싶다는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비트겐슈타인으로부터 답장을 받지 못하여서 결국 카르납의 제자가 되는데, 트리포디는 콰인이 그 당시에 비트겐슈타인이 아니라 카르납과 만난 것이 분석철학 역사의 '전환점'이라고 말하네요.
"잘 알려져 있듯이, 콰인은 1932년에 화이트헤드 밑에서 박사학위를 받고서 공부를 위해 유럽에 갔다. 그가 비엔나에 있었을 때, 그는 "예언자를 알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대한 비트겐슈타인에게 편지"를 썼다. 콰인은 자신의 부모님에게 보낸 편지에서 의문을 가졌다. "그가 제 요청에 따라 행동할지는 지켜봐야합니다. (그는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콰인이 많은 세월 이후에 언급한 것처럼, "물론 그는 답장을 하지 않았다"(Quine 1985: 88). 상징적으로, 이러한 일화는 분석철학의 역사에서 시사하는 바가 많은 전환점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만일 그 당시에 콰인이 비엔나에서 비트겐슈타인과 만났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하는 것이 흥미롭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바로 이후에 , 콰인은 대신 프라하로 갔고, 카르납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이다."(Tripodi, 2020: 75)
하지만 콰인이 비트겐슈타인과 만났다고 해서 과연 분석철학의 역사가 달라졌을까요? 비트겐슈타인과 더밋의 만남을 떠올려 보면, 별 일이 없었을지도...
약간 농담삼아 "별 일이 없었을지도"라고 쓰기는 하였지만, 비트겐슈타인에 대한 회고록들을 읽어보면 적어도 비트겐슈타인은 자기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진지하고 열정적인 인물이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비트겐슈타인의 러시아어 과외 교사였던 파니아 파스칼은 비트겐슈타인이 사람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매우 혹독한 사람이라고 비판하면서도, 그가 인격적으로 흠 잡기 어렵고, 순수하고, 삶의 큰 전환점에 있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인물이라고 인정하니까요.
“그[비트겐슈타인]는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데 탁월한 능력을 지녔다. 그의 인격의 완전성은 그를 향한 비판을 일종의 트집 잡기처럼 보이게 만든다. 하지만 나는 타인의 약점을 발견해서 맹렬히 공격하는 그의 능력을 결점이 아니라고 간주할 수 없다. 그가 동시에 아주 순수하고 순진한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 해도 내 감정은 바뀌지 않는다”(파니아 파스칼, 「비트겐슈타인: 사적인 회고록」, 『비트겐슈타인 회상록』, 러시 리스 엮음, 필로소픽, 2017, 69쪽)
“만약 당신이 살인을 저질렀거나, 결혼이 파탄났거나, 개종을 하려 한다면 비트겐슈타인은 조언을 구하기에 가장 좋은 사람일 것이다. 그는 거절하지 않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두려움이나 불안으로 고통받거나 적응을 잘 하지 못한다면, 그는 거리를 두어야 할 위험한 인물이다. 그는 일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공감하지 못하며, 그의 처방은 외과적이고 너무나도 극단적일 것이다.”(파니아 파스칼, 「비트겐슈타인: 사적인 회고록」, 69쪽)
- 오늘의 결론은 "메일 답장 제때 안 하면 비트겐슈타인 같은 철학자라고 해도 잊혀진다"(?)가 아닐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