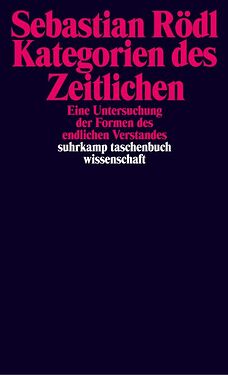일전에 인상깊게 읽었던 글에 덧붙여,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른 흥미로운 철학자와 그의 책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제목은 『시간성의 범주들』 (영역: The Categories of the Temporal; 독일어 원제: Die Kategorien des Zeitlichen)이고, 저자는 독일 라이프치히 대학의 교수 세바스티안 뢰들 (Sebastian Rödl)입니다. 이 책은 저자의 2003년 교수자격논문(하빌리타치온)이고 독일어로 출간된 뒤 2012년에 영역되었습니다. (저 역시 영역본으로 읽었습니다.)
뢰들의 책을 그 전에 읽어본 적은 없었지만 뢰들의 존재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를 주목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다름 아닌 맥도웰이 후기 저작들에서 뢰들의 2007년 저작 『Self-Consciousness』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인용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맥도웰은 지각 철학(philosophy of perception)에서의 이슈들에서 자기의식을 다룰 때, 뢰들의 책을 거의 자신의 대변자인 양 아주 호의적으로 인용하고는 합니다. 실제로 2013년에 『Self-Consciousness』에 대해 논평하는 자리에서 맥도웰은 자신이 논평을 맡은 두번째 챕터에 대해 “... in my view it’s almost perfect …”라고 극찬한 바 있습니다 (그 뒤의 문장이 “… so almost perfect, not quite perfect” 이긴 합니다 ![]() https://youtu.be/86VcxLG8X8I?feature=shared ). 그 까다로운 맥도웰의 철학적 취향을 저격할 수 있다니, 그의 철학이 좀 궁금해졌습니다.
https://youtu.be/86VcxLG8X8I?feature=shared ). 그 까다로운 맥도웰의 철학적 취향을 저격할 수 있다니, 그의 철학이 좀 궁금해졌습니다.
그의 넓은 관심사도 한 몫 했습니다. 그의 작업물은 역사적으로는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아퀴나스, 칸트, 헤겔, 프레게와 비트겐슈타인까지 고대-현대를 넘나들고, 체계적으로는 심리철학, 언어철학, 인식론, 도덕철학, 행위이론을 다루는 범상치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커리어적으로 그는 피츠버그 대학에 여러 번 체류할 정도로 피츠버그 학파의 학술전통과 매우 가깝고, 따라서 셀라스, 맥도웰, 브랜덤 등의 논의에 정통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외에도 독일인 교수님 한 분이 이 책을 추천해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뢰들이 독일산 천재철학자로 명성을 꽤 날렸다 하더군요. 아무튼 철학사와 현대철학의 교류에 관심이 있는 저로서는 언젠가 한 번 꼭 읽어보고 싶은 철학자였습니다.
책의 제목이 『시간성의 범주들』인 만큼 “시간이란 무엇인가”를 둘러싼 과학철학적 논의를 기대하셨다면,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이 책은 분명 “시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하나의 답이 될 수 있지만, 이것이 과학철학의 맥락에서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 범주”의 맥락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자의 기획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자가 말하는 “범주”가 무엇인가에 대한 감을 먼저 잡아야 합니다.
뢰들은 아주 흥미로운 구분을 제시합니다. 그는 현대 분석철학에서 논리학적 전통을 크게 2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프레게를 따르는 (좁은 의미의) 논리학과 비트겐슈타인을 따르는 (넓은 의미의) 논리학입니다. 전자는 사유(thought)와 사유 사이의 연역적 질서를 다루고, 술어논리와 같이 특정 계산 체계를 통해 이를 범주화합니다. 반면 비트겐슈타인을 따르는 전통은 인간 지성의 경우 대상이 주어져야 유의미한 사유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사유와 사유 사이의 연역적 질서 이전에, 인간의 사유에 대상이 주어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에 요구되는 논리적 범주들이 무엇인지를 탐구합니다. 통칭 비트겐슈타인의 “문법 grammar”이라고 불리는 이 논리적 범주들은, 프레게적 전통의 연역적 논리학을 가능하게 하는, 따라서 형식논리학의 범주들보다 더 근원적인 범주들입니다 (같은 이유에서 과학철학의 논의들 보다도 더 근원적이라고 말합니다). 저자는 이러한 비트겐슈타인적 “문법”을 따르는 철학자들로서 라일, 앤스콤, 맥도웰 등을 인용하고 있는데, 문제는 (비트겐슈타인 포함) 이들이 구체적으로 이러한 문법이 어떠한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는 점에서 불만족스럽다고 말합니다. 이 책의 목표는 바로 이 비트겐슈타인적 문법을 명시적으로 만들기에 있습니다.
이 책은 1부와 2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부는 비트겐슈타인적 논리학과 프레게적 논리학을 구분하고 양자의 차이를 명확하게 밝힘으로써 가능한 혼동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저자는 비트겐슈타인적 논리학을 칸트의 선험적 논리학과 연결시킵니다. 대상이 인간의 사유에 주어질 때 그 기저에 깔려 있는 문법을 탐구한다는 것은, 직관이 지성에 주어질 때 선험적으로 전제되는 논리적 범주들을 명시적으로 밝히는 작업과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뻔하디 뻔한 스텝인데, 진짜 하이라이트는 그 이후의 내용에 있습니다. 저자는 왜 “시간”이 이 문법의 중심에 서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그 과정에서 비트겐슈타인적/프레게적 논리학의 구분을 현대 분석철학에서의 여러 논쟁들과 연결시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Frege, Dummett, Burge, Quine, Prior, Davidson, Brandom 등 굉장히 많은 철학자들을 꽤나 상세하게 비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저자의 주된 전략은, 기존 현대 철학에서 시간을 둘러싼 여러 논쟁들이 이 “시간”을 프레게적인 논리학의 전통에서 오직 형식논리적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생긴 (가짜-)문제들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시간을 형식논리적으로 다루지 않고 비트겐슈타인의 전통에 입각하여 문법이라는 논리적 형식으로 다룬다면 이 논쟁들은 애초에 발생하지 않거나 쉽게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자가 다루는 논쟁 중에, 시간을 둘러싼 논리학적, 형이상학적 논쟁이 있습니다. “a는 F이다”라는 진술에 시간을 추가할 때, 시간을 대상 a에 부여할 것인지 (t1에서의 a, t2에서의 a …), 아니면 시간을 술어에 귀속시킴으로써 동일한 대상 a에 상이한 술어 (F(t1), F(t2) …)를 부여할 것인지에 따라 시간의 형이상학적 성격(perdurance/endurance)이 달라진다는 논쟁입니다. 이 논쟁에 대한 저자의 해결책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저자에 따르면 시간 자체는 감각/지각될 수 없기 때문에 애초에 시간은 대상처럼 다루어질 수 없고, 따라서 시간을 프레게적 이름 (t1, t2, t3 ...)으로 다루는 것에서부터 이미 형식논리학적 전통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면 비트겐슈타인적인 문법 아이디어를 따르자면, 시간은 내용에 주어지거나 이름처럼 다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의 기저에 깔려 있는 형식 즉 범주인 것입니다. 물론 사유와 사유 사이의 관계를 연역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시간 이름을 (목적에 따라) 대상이나 술어에 귀속시키는 체계를 충분히 세울 수 있습니다 (뢰들은 이 효용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형식논리적 체계 혹은 표기법이 시간의 형식적/범주적 측면을 포착하고 있다고 착각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2부에서는 1부에서의 구분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문법 속에 시간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를 명시적으로 만드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인간 지성의 선험적 문법 속에 과거/현재의 시제(tense) 구분과, 진행/완료의 상(aspect) 구분, 그리고 그 안에 전제되어 있는 총칭적(generic) 사유를 제시합니다. 예컨대 저자가 말하는 시제와 상의 구분을 합치면 “S is doing/was doing/has done A”의 3가지 문법 형식이 명시적으로 드러납니다.
개인적으로 2부의 논의는 1부에 비해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비트겐슈타인적 문법을 명시적으로 만드는 이 책의 목표가 많은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던 반면, 그 결과로 주어지는 위의 3가지 구분은 약간 유치하기도 하고, (약간의 ad hominem을 덧붙이면) 인도유럽어만을 구사할 줄 아는 독일철학자가 결국 상상력의 경험적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다는 인상을 줍니다. 물론 뢰들은 위의 삼분법이 특정 자연언어의 언어적 문법과는 구별되어야 하는 “선험적“ 문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독일어에서는 was doing/has done 을 구별시켜주는 문법적 장치가 존재하지 않지만, 이것이 자신의 주장에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특정 자연언어의 문법과 선험적 문법을 구별해야 한다는 뢰들의 지적은 아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한국어도 영어의 “현재완료” 시제와 완전히 동일한 문법적 상관자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한국인이 영어의 “현재완료” 시제가 표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데 딱히 어려움이 없다는 점에서, 충분히 is doing/was doing/has done 을 시간에 대한 선험적 문법으로 인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에게 여전히 의심이 가시지 않는 것은, 이러한 시제+상의 구분은 모종의 (더 근원적인) 시간 문법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결과”일 뿐 그 자체가 선험적 문법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는 점, 저자가 기껏해야 영어, 독일어, 라틴어, 고대 그리스어의 예시 약간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것이 과연 비-인도유럽어 구사자들에게 설득력이 있을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책을 강력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한편으로는 1부의 내용이 워낙 흥미롭고 강력해서 그 외의 단점을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비록 제가 2부의 내용을 혹평하긴 했지만 저자가 논의를 전개하는 방식이나 소재들이 매우 독창적이어서 유사한 주제를 연구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영감을 제시해줄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분들에게 강추드립니다: 시간에 대한 현대철학적 논의에 관심 있으신 분은 물론이고, 비트겐슈타인의 철학 (특히 "문법")에 관심 있으신 분들, 아리스토텔레스와 칸트의 (특히 시간-)철학에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이 책은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칸트가 이 책에서 저자의 이론적 원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책이 아리스토텔레스, 칸트, 비트겐슈타인에 대한 철학사적 논의에 한정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철학사적 지식은 없어도 책을 읽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 오히려 현대 분석철학에 대한 배경지식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이 읽기에 유리합니다. 저자가 아무래도 현대 분석철학 논의와 철학사를 접목시키는 쪽으로 나아가다 보니, 프레게나 콰인, 에반스 등에 대한 대략적인 지식이 있으면, 저자가 무엇을 문제삼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지가 훨씬 쉽게 이해됩니다. (저 같은 경우 뢰들이 현대 철학을 비판적으로 다루는 방식(특히 콰인 비판)에서 배운 것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현대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현대철학이 철학사로부터 배울 수 있는게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또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엿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