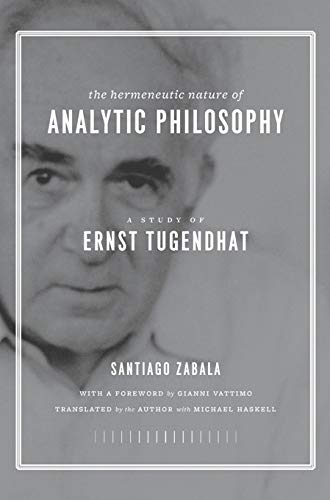책 읽다가 몇 가지 흥미로운 내용이 있어서 올려봅니다.
"존재는 실제적인 술어(real predicate)가 아닌데 왜냐하면 '긍정의 보편적 현상은 말해질 수 없기 때문이다.' 투겐트하트는 '언어가 존재 속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아니라 '존재가 언어 속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질문함으로써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는데, 왜냐하면 그는 항상, 언어에 대한 하이데거와 가다머의 강조점을 따라서, '우리가 이해하면서 살고 있는 보편적 차원이란 원초적으로 대상, 존재자, 사실의 세계가 아니라 문장의 세계'라고 사유하기 때문이다. 존재의 영역을 논의하기 위해 하이데거가 '개방성(openness)'이라는 개념을 사용했고 가다머가 '언어(language)'라는 개념을 사용한 곳에서, 투겐트하트는 '문장(sentence)'이라는 실천적 개념을 사용한다."(Santiago Zabala, The Hermeneutic Nature of Analytic Philosophy, Santiago Zabala & Michael Haskell (tran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8, p. 52.)
"투겐트하트는 하이데거가 전통적 개념들에 대해 급진적으로 물음을 제기하였다고 믿을 뿐만 아니라 [하이데거가] 그의 현상학적 기술의 방법을 통해 그렇게 질문을 던짐으로써 또한 그가 '분석철학보다 더 멀리 나아갔다'고 믿는다. 하지만 그의 기술적 방법은 검증 가능성의 기준을 결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아이디어들은 '직관적이며 증명되지 않은 논제들로 남겨졌다.' 하이데거의 철학에 대한 검증은 오직 언어 분석의 상호주관적이고 의미론적인 검토를 통해 일어날 수 있는데 왜냐하면 하이데거 자신이 '존재 이해의 언어성'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투겐트하트의 탐구에 따르면, 하이데거는 존재에 대한 이해, 그리고 특별히 우리 자신의 존재함(to-be)에 대한 우리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문장 속에서 표현'되어야 한다는 필연적 결론으로부터 뒷걸음질 친다. 하이데거는 사실 철학의 주제가 '이해'라고, '현상학적 기술'이 해석이라고, 또한 그의 방법이 '해석학'이라고 생각하였지만, 그는 후설을 넘어서 나아가기 위해 이러한 '해석학적 방법'을 위한 어떠한 기준도 만들고자 시도하지 않았다. 그의 철학의 의사소통적 특성을 '연상적(evocative)'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이러한 기준의 결여이다. 하지만 투겐트하트가 분석적 철학을 통해 채우고자 하는 것은 하이데거의 철학 속 바로 이러한 결점이다."(Santiago Zabala, The Hermeneutic Nature of Analytic Philosophy, Santiago Zabala & Michael Haskell (tran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8, p. 54.)
재미있는 포인트들
(1) 존재는 '실제적 술어'가 아니다. 즉, "~이다."에 대응하는 객관적 존재가 외부에 미리 놓여 있는 것이 아니다.
(2) 하이데거와 가다머는 우리의 세계가 '존재자(entity)'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문장(sentence)'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강조한다.
(3) 하이데거는 통찰력 있는 아이디어들을 많이 제시하였지만, 자신의 아이디어들을 명료하게 만들지는 못했다.
(4) 존재에 대한 하이데거의 사유는 결국 문장에 대한 의미론적 분석을 통해 해명되어야 한다. 즉, 존재에 대한 논의는 우리가 "~이다."라는 술어를 사용하는 방식에 대한 논의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