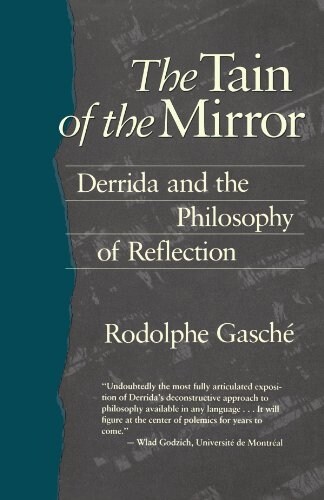
이번 학기에 데리다에 대한 글을 써보고 싶어서 한 달 전쯤에 지도교수님께 조언을 구했더니, 영어권 데리다 해석에서 권위 있는 연구서로 The Tain of the Mirror라는 책을 추천해주시더라고요. 저는 리처드 로티의 글을 통해 저 책의 저자인 '로돌프 가셰(Rodolphe Gasché)'의 이름은 알고 있었지만, 그동안 가셰의 책을 직접 읽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이번에 책을 꼼꼼하게 살펴보았는데, 상당히 수준이 높고 흥미로운 내용을 담고 있더라고요.
가셰가 책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것은 근대철학의 '반성(reflection)' 개념입니다. 의식은 마치 거울처럼 외부 대상을 비춘다는 생각, 그리고 자기 의식은 외부 대상을 비추는 의식을 다시 비추어 이론적으로 구조화한다는 생각, 그래서 자기 의식의 구조를 철학의 근본적 토대로 삼아 확실한 지식의 체계를 성립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바로 근대를 지배했던 '반성 철학(philosophy of reflection)'입니다. 한 마디로, "나는 내가 생각한다는 것을 생각한다."라는 토대가 철학의 가장 밑바탕에 놓여야 한다는 것이 근대적 반성 개념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데리다의 철학은 바로 이러한 반성 개념을 집중적으로 비판한다는 것이 가셰의 해석입니다. 반성철학과 반성철학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이항대립들(가령, 주체/객체, 순수/비순수, 기원/비기원, 자연/사회 등)은, 사실 반성철학에서는 주제화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거부되어야 하는 '하부구조(infrastructure)'가 전제된 상황에서만 성립한다는 것이 (가셰가 해석한) 데리다의 입장입니다. The Tain of the Mirror라는 책 제목도 바로 이 점을 나타내주고 있죠. 'Tain'은 거울 뒤편에 있는 주석박입니다. 가셰는 바로 반성 활동이 가능하기 위해 반성 활동과는 이질적인 하부구조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거울(mirror)'이 물체를 비추기 위해 그 거울 뒤편에 '주석박(Tain)'이 놓여 있어야 한다는 비유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런 가셰의 해석은 데리다의 해체주의를 칸트의 초월철학과 긴밀하게 연관짓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칸트가 경험을 성립시키는 '초월적 조건'을 제시하려고 했던 것처럼, 데리다도 반성을 가능하게 하는 '하부구조'를 들추어내고자 한다는 거죠. 국내 연구자 중에서는 진태원 선생님이 이런 가셰의 데리다 해석을 지지하시면서 「유사초월론: 데리다와 이성의 탈구축」이라는 논문을 쓰시기도 하셨더라고요. 반대로, 가셰의 해석에 반대하는 로티는 「데리다는 유사초월론자인가(Is Derrida a "Quasi"-Transcendental Philosopher)?」라는 논문을 썼고요.
저는 가셰의 해석에 완전히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더 정확히는, 가셰가 데리다를 설명한 '내용' 자체는 거의 올바르지만, 설명하는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봐요. 가령, 데리다는 항상 (레비스트로스나 루소 같은 인물들의) 고전적 텍스트를 따라가는 과정에서, 그 텍스트에 담긴 아포리아나 모순을 들춰내는 방식으로, 그 텍스트가 상정한 구조 이면의 더 근본적 구조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가셰는 마치 더 근본적 구조를 우리가 텍스트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직접 주제화할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죠. 제가 보기에, 이렇게 '하부구조'를 직접적으로 주제화하려는 시도는 (데리다가 항상 경계했던 것처럼) 형이상학을 비판하기 위해 또 다른 형이상학을 끌어들이는 작업으로 귀결될 위험을 언제나 내포하고 있어서, 저는 이런 설명 방식이 지양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 책이 정말 뛰어난 데리다 연구서라는 점은 부정할 수가 없네요. 특별히, 가셰가 데리다를 해설하기 위해 데카르트로부터 헤겔까지에 이르는 근대철학의 역사를 '반성'이라는 과점에서 재구성하는 부분이나, '반성' 개념에 대해 현대철학에서 제시된 다른 여러 비판들을 데리다의 입장과 비교하는 부분에서는 정말 놀랐습니다. 상당히 광범위한 논의들을 하나의 맥락에서 엮어내는 솜씨가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데리다의 입장이 다른 철학적 논의들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특징과 강점을 지니고 있는지를 살펴보기에는 이만한 연구서도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