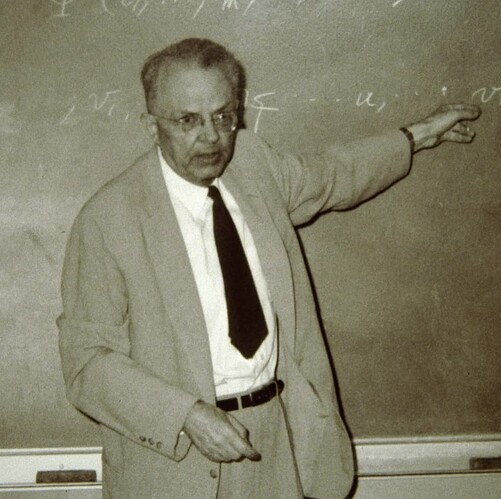저는 콰인의 "On What There Is"가 오늘날 영미철학에서 형이상학의 부활을 가져왔다는 점이 항상 이상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콰인이 '존재론적 개입'의 기준을 제시한 것은 맞지만, (그래서 우리가 특정한 이론을 참이라고 주장할 때 어떤 존재자들의 목록을 상정하고 있는지 분석할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한 것은 맞지만,) 존재론적 개입 기준에 대한 콰인의 논의 자체가 (a) 특정한 존재론적 입장을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b) 서로 경쟁하는 존재론적 입장들 중에서 무엇이 더 우위에 있는지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실제로, 콰인 본인은 존재론의 문제에 대해 철저하게 실용주의적이고 상대주의적인 입장을 견지했죠. 그래서 「존재하는 것에 관하여」의 말미에서 모든 종류의 존재론이 근본적으로 '신화'라고 강조하기도 하였고, 말년에 자기 철학을 집약해서 쓴 대표적인 논문에 "존재론적 상대성(Ontological Relativity)"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하였으니까요. 데이비드 맨리(David Manley)도 Metametaphysics: New Essays on the Foundations of Ontology의 서문에서 휴 프라이스(Huw Price)의 논문을 인용하면서 콰인의 철학이 반드시 형이상학의 부활을 함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휴 프라이스의 논문은 또한 콰인에 대한 기록을 바로잡는 것을 목표로 한다. 비록 최근의 철학적 지식은 실증주의자로부터 형이상학을 구한 공로를 콰인에게 두지만, 프라이스는 이러한 생각이 두 가지 심각한 오해를 포함한다고 주장한다. 첫째로, 분석-종합 구분에 대한 콰인의 거부는 카르납의 축소주의적 논증을 성공적으로 약화시킨 것으로 종종 생각된다. 하지만 프라이스는 분석-종합 구분이 카르납의 축소주의가 지닌 반형이상학적 힘과는 거의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두 번째로, 콰인이 그의 논문 "On What There is"(1948)를 통해 전통적 형이상학을 보강하였다고 종종 생각되지만, 프라이스는 이러한 생각이 근본적으로 철저한 실용주의자인 콰인에 대한 심각한 오독을 포함한다고 논증한다. 짧게 말해, 팽창적 형이상학이 카르납과 함께 사망한 반면, 콰인에 의해 부활하였다는 것은 신화이다. (David Manley, "Introduction", Metametaphysics, David Chalmers, David Manley & Ryan Wasserman (eds.), Oxford: Clarendon Press, p. 6.)
그런데 맨리가 말한 프라이스의 논문 "Metaphysics after Carnap"을 읽어보니, 첫 서두부터가 재미있네요. 20세기 중반의 미국철학자가 뉴저지의 고속도로에서 심각한 교통체증을 겪다가 차에서 낮잠에 빠졌는데, 60년 뒤에 깨어나서 'Carnap''이라고 불리게 된 상황을 상상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차에서 낮잠 자다가(Car Nap) 카르납(Carnap)'이 된 거죠. 아마 그 카르납'은 2000년대 이후의 철학계에서 '실재론'이니, '비실재론'이니, '허구주의'니 하면서 "커피 종류보다도 존재론적 선택지가 더 많이 있다는 사실, 노숙인보다도 형이상학자가 더 많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아 "그들은 도대체 언제쯤 배우게 될까?"하고 중얼거릴 것이라고 하네요. 내용이 다소 길다 보니, 구글 번역기로 돌린 것을 살짝 수정하여 여기에도 인용해 봅니다.
1950년 어느 조용한 여름 오후, 잘 훈련된 20세기 중반 미국 철학자가 뉴저지 유료 고속도로에서 드물게 교통 체증을 겪었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는 따뜻한 차에서 졸다가 ... 그리고 같은 장소에서 깨어납니다. 2008년 가을 저녁, 그 사이의 세월이 전혀 기억나지 않습니다. 마치 그가 거의 60년 동안 운전대를 잡고 잠든 것 같습니다!
그가 자신의 특이한 상황의 긍정적인 면을 보았다고 가정해봅시다. 현상학적으로 그것은 시간 여행과 동등하며, 열정적인 철학자가 그것에 흥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는 자신이 실제로 반세기 이상 미래로 이동했거나 유료 고속도로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남았다는 것보다 자신이 기억상실증을 앓고 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억이 곧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가능한 동안 이 경험을 음미해야 할 이유가 더욱 커집니다.
실제로 그는 올리버 색스가 The New Yorker에 기고하여 곧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무례한 대학원생들은 그를 현대철학의 카르납'이라고 부르며(Beth에게 사과함 1963, 478) 모든 사람들은 현대 생활에 대한 그의 인상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가 속한 사회에서 무엇이 그를 놀라게 하겠습니까? 현대 뉴욕을 아는 호주 철학자라면[휴 프라이스는 호주 철학자임-주석] 눈에 띄는 몇 가지 사항을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커피 한 잔에 잔돈을 요구하는 사람의 수[뒤의 내용으로 보아 잔돈을 구걸하는 거지들을 의미하는 듯-주석], 커피를 살 때 사용할 수 있는 엄청나게 다양한 옵션, 커피 한 잔, 가장 작은 커피조차도 엄청난 크기 등등. 그러나 카르납'이 이 모든 것을 무시할 수 있는 진정한 철학자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학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싶어합니다. "거지들과 스타벅스는 지옥으로!" 그는 외쳤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철학의 큰 진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시점에서 호주의 직관은 덜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호주의 철학적 청중은 Carnap'이 가장 놀랍게 여길 현대철학의 특징 중 하나, 즉 형이상학의 명백한 건강성을 친숙하게 여깁니다. 1940년대 후반, Carnap'은 빈곤과 마찬가지로 형이상학도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고 회상합니다. 그러나 요즘 그가 가는 곳마다 형이상학적 입장을 옹호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에 대해 '현실주의자'라고 주장하고, 저쪽에 대해서는 '비현실주의자'라고 주장하며, 다른 것에 대해서는 '허구주의자'라고 주장합니다. 뉴저지와 뉴잉글랜드의 대학 도시에서 Carnap'은 커피 종류보다 존재론적 선택이 더 많고, 노숙자보다 형이상학자가 더 많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노인, 허약자, 정신질환자의 고통이 아닙니다. 그의 부모 세대의 대전처럼 현대 형이상학은 한 세대의 가장 우수하고 뛰어난 세대를 주장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언제쯤 배우게 될까?" 카르납'은 혼잣말로 중얼거립니다. 아마도 그에게는 아니더라도 우리에게는 그 사이의 세월에 대한 기억이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것입니다.
Huw Price, "Metaphysics after Carnap", Metametaphysics, David Chalmers, David Manley & Ryan Wasserman (eds.), Oxford: Clarendon Press, pp. 32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