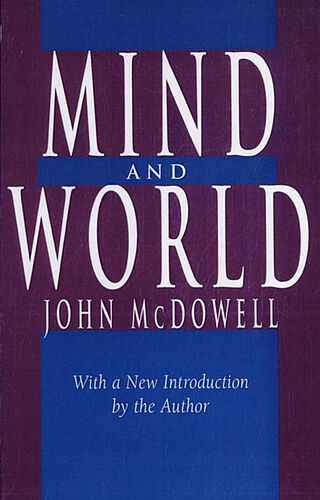맥도웰의 『마음과 세계』제6장 '합리적 동물과 그렇지 않은 동물(Rational and Other Animals)'은 무려 한스게오르크 가다머와 칼 마르크스의 논의를 바탕으로 '세계를 가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해명한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이 책에서 가장 흥미롭게 생각하는 부분들 중 하나입니다. 하이데거와 가다머의 현상학적-해석학과 셀라스-맥도웰의 개념주의가 직접적으로 마주치는 부분이라, 철학적 해석학을 전공하는 입장에서는 눈길이 가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저로서는 이 책의 다른 부분들보다 유독 이 부분에서 전개되는 맥도웰의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더라고요. 맥도웰은 '세계(world)'와 '환경(environment)'을 서로 엄격하게 구분하면서, 합리적 동물인 인간은 '세계'를 가지지만, 그렇지 않은 단순한 동물들은 단순히 '환경'에만 반응할 뿐이라고 강조하거든요. 물론, 단순한 동물들도 '민감성(sensitivity, 감성)'을 지닌 지각적 존재로서 배고픔, 기쁨, 고통 같은 다양한 감각과 감정을 충분히 느낄 수 있고, 또한 그 감각과 감정에 따라 주변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자동 기계'라고 할 수 없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맥도웰도 동의합니다. 다만, 동물들이 인간처럼 자신들의 판단을 정당화하거나 수정하면서 '세계관'을 지속적으로 형성할 개념적 능력은 없으며, 바로 그 점에서 '객관적 실재'에 대한 경험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맥도웰의 주장입니다.
즉, 맥도웰에 따르면, '객관성'이나 '객관적 실재'라는 것은 단순한 자극-반응의 대상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있는 판단의 대상입니다. 단순한 동물들은 바로 자신의 판단을 정당화하거나 수정하면서 그 대상에 대한 판단이 왜 옳고 그른지를 따질 수 있는 '자발성(spontaneity)' 혹은 '개념적 능력(conceptual capacity)'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객관적 실재에 대한 경험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무엇인가를 느꼈다고 해서 그 느낌 자체가 곧바로 객관적인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느낌이 무엇인지, 혹은 그 느낌이 왜 허구가 아닌지를 '판단'의 형태로 제시하고 입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에야 비로소 그 느낌이 객관적인 것이라는 주장이 유의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적어도, 인간은 이러한 '담화적 활동(discursive activity)'을 수행할 능력이 있지만, 동물은 그 능력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물은 엄밀한 의미에서 객관적 실재를 경험한다고 할 수도 없고 세계를 가진다고 할 수도 없다는 것이 맥도웰의 요지입니다.
그런데 저는 '합리적 동물'과 '그렇지 않은 동물'에 대한 맥도웰의 구분을 볼 때마다 두 가지 정도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단순히 이 주장이 '인간중심주의'라는 이념을 담고 있어서는 아닙니다. (맥도웰은 그런 정치사회적 이념을 옹호하지도 않고, 그런 정치사회적 이념에 딱히 관심도 없는 철학자입니다.) 오히려 맥도웰의 구분이 '개념적 능력'이나 '담화적 활동'을 너무 협소하게 정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요. 인간이 지닌 아주 정교한 개념적 능력 이외에도, 개념적 능력에는 여러 가지 층위가 있다고 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정말로 동물에게 '개념적 능력'이 없는 것인지 저로서는 의문스럽더라고요. 가령, 스토아 학파의 논리학자 크리쉬포스가 관찰한 것처럼, 개들조차도 일종의 '선언적 삼단논법' 같은 추론을 사용하기도 하잖아요. 멧돼지의 뒤를 쫓던 사냥개가 A 길과 B 길이 나뉘어지는 갈림길에 이르러, A 길의 냄새를 맡더니 멧돼지 냄새가 나지 않자 곧장 B 길로 갔다는 것이 크리쉬포스가 전해주는 유명한 일화거든요. 이 일화대로라면, 그 사냥개는 "A ∨ B / ~A / 따라서 B"와 같은 아주 기초적인 형식의 선언적 삼단논법을 이해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동물도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는 자신이 어떠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지에 대해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행동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2) 인간이 동물의 행동을 개념적인 형태로 재구성해서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인간의 사유와 동물의 사유 사이에 일종의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가령,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밥그릇을 물고 와서 "멍멍"거리면, 우리는 "얘가 배가 고픈가 보다."하고 이해하고, 산책줄을 물고 와서 "멍멍"거리면, 우리는 "얘가 밖에 나가고 싶은가 보다."하고 이해하잖아요. 인간이 동물의 행동에 대해 '이유'를 추론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추론한 '이유'를 바탕으로 동물과 의사소통할 수 있다고 한다면, 과연 인간의 사유와 동물의 사유 사이에 근본적인 단절이 있다고 볼 수 있을지 저로서는 의문스럽더라고요. 의사소통이 된다는 것은 인간과 동물이 서로의 판단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니까요. 단지 동물은 세계에 대해 정교한 판단을 내리지 못할 뿐이라거나, 그 판단을 세련된 형태로 표현하지 못할 뿐이지, '판단' 자체를 만들 능력이 없다고 보는 것은 너무 과한 주장이 아닌가 합니다.
내가 지난 강의에서 논의했고, 이번 강의에서도 앞서 다시 상기시킨(§2) 칸트의 논제의 일부를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객관적 세계는 자기의식적 주체에게만, 곧 경험을 자기 자신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주체에게만 현전한다는 것입니다. 경험이 세계에 대한 자각을 구성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경험을 귀속시킬 수 있는 주체가 지닌 능력의 맥락 속입니다. 이제 이것은 내가 세 번째 강의(§3)에서 주목했던 하나의 제약으로 우리를 되돌립니다. 세계와 자아를 관점 속으로(in view) 데려오는 것은 지성의 자발성, 곧 개념적 사유의 힘입니다. 개념적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생물은 자기의식을 결여하고 있으며—이것은 같은 맥락의 일부인데—객관적 실재에 대한 경험을 결여합니다.
나는 이 제약이 단순한 동물들의 지각적 능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단순한 동물들은, 지성의 자발성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칸트적 논제의 범위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동물들이 경험의 전달물에 대해 합리적으로 반응하여 세계관을 지속적으로 재형성한다고 여길 수가 없습니다. 만일 합리적 반응이라는 관념이—무엇이 무엇에 대한 이유인지 재평가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서, 또한 그에 따라 자신의 반응 성향을 바꾸는—자신의 사유를 통제하는(in charge of) 주체를 요구한다면 말입니다. 이 사실로부터, 내가 제안한 “외적 경험”에 대한 구상에 따르면, 단순한 동물들은 “외적 경험”을 향유할 수 없다는 점이 도출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짐승들이 자동인형이라는 데카르트적 관념에 나를 개입시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의 생각은 내가 에반스에게서 발견한 생각의 한 형태입니다(제Ⅲ강, §7). 우리가 단순한 동물들과 지각을 공유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부분적으로 그 사실에 근거하여, 에반스는 우리가 지각 가능한 세계에 대해 판단을 내릴 때, 우리가 단순한 동물들과 공유하는 종류의 체험적 내용을 개념적 형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그래서 체험적 내용은 비개념적일 수밖에 없다고 제안합니다. 내가 세 번째 강의에서 이러한 주장을 논의했을 때, 나는 에반스의 결론을 허용하지 않는 칸트적 틀의 일부를 마련해 두고 있었습니다. 나의 주장은, 경험에 대한 판단이 비개념적 내용에 기초한다고 에반스가 주장할 때, 그는 칸트가 우리를 구해내려 했던 무익한 진동의 한쪽 극인 ‘소여의 신화’의 한 형태에 빠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왜 에반스의 결론이 칸트적 틀에 들어맞지 않는지에 대한 또 다른 각도를 얻습니다. 즉, 왜 감성이 개념적이지 않으면서도 이미 세계를 포함하는 내용을 스스로 산출한다고 가정하는 것을 그 [칸트적] 틀이 금지하는지에 대한 또 다른 각도 말입니다. 자발성이 결여된 상태에서는, 어떠한 자아도 관점 속에(in view) 드러날 수 없고, 마찬가지로 세계도 관점 속에(in view) 드러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명백한 거짓을 함의한다는 걱정은 어떨까요? 즉, 단순한 동물은 진정으로 지각적 존재(sentient)가 아니라는 명백한 거짓 말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나는 환경 속에서 사는 단순한 동물적 삶의 양태와 세계 속에서 사는 인간적 삶의 양태 사이의 차이에 대한 인상적인 기술을 한스게오르크 가다머에게서 빌려오고자 합니다. 나의 목적상, 이러한 기술의 요점이란 어떻게 인간과 짐승 사이의 공통점을 인정하면서도, 칸트적 논제가 우리에게 강요하는 차이를 보존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는 데 있습니다.
단순한 동물들에게서, 지각성(sentience)은 직접적인 생물학적 충동에 의해 배타적으로 구조화된 삶의 양태를 위해 봉사합니다. 이러한 사실이 그 삶이 개체와 종의 생존을 유지하려는 투쟁에만 제한된다는 것을 함의하지는 않습니다. 생존이나 번식과는 기껏해야 간접적으로만 연결된 직접적인 생물학적 충동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많은 동물들에게서 발견되는 놀이 충동과 같은 것 말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제약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단순히 동물적인 삶이 목표들에 의해 형성된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데, 그러한 목표들은 특정 순간에서 동물의 행동을 지배하는데 있어 생물학적 힘들의 직접적 결과입니다. 단순한 동물은 이유들을 저울질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이제 가다머의 논제는 이렇습니다. 즉, 오직 그러한 방식으로만 구조화된 삶은 세계(world) 안에서가 아니라 단지 환경(environment)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삶이 오직 그러한 종류의 형태으로 이루어진 생명체에게 그것이 살아가는 주변 환경(milieu)은, 그 생물학적 충동들에 의해 그렇게 구성되는 문제들과 기회의 연속 이상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개념적 힘을 획득할 때, 우리의 삶은 단지 즉각적인 생물학적 충동에 의해 그렇게 구성된 문제들에 대처하고 기회들을 이용하는 것뿐 아니라, 무엇을 생각하고 행할지를 결정하면서, 자발성을 행사하는 것을 것을 포괄하게 됩니다. 제2의 자연에 대한 자연주의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말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는 다른 종류의 자연주의 맥락에서는 문제가 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즉 이러한 자유의 행사가 우리의 삶의 요소, 곧 살아 있는 존재이자 자연적인 존재로서의 우리의 행적(career) 안의 요소라는 점입니다. 물론 우리의 존재가 우리 삶을 통제한다는(in charge of) 것이 생물학을 초월함을 의미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주장은 방만한 플라톤주의적 환상의 한 형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삶의 형태가 더 이상 직접적인 생물학적 힘들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방만한 플라톤주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지성의 자발성을 획득한다는 것은, 가다머의 표현을 빌리면, “세계로부터 우리에게 부딪혀 오는 사물이 지닌 압력 위로 솟아올라” (Truth and Method, 444쪽)—곧 생물학적 충동에 의해 그렇게 구성된 문제들과 기회의 연쇄 위로 솟아올라—“자유롭고, 거리두어진 지향” (445쪽)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향이 자유롭다는 사실, 곧 그 지향이 생물학적 욕구의 압력 위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그 지향을 세계에 대한 지향으로 특징짓습니다. 자발성의 능력을 지닌 지각자에게, 환경은 문제들과 기회의 연쇄 이상입니다. 환경은 그의 지각적이고 실천적인 범위 속에 있는 객관적 실재의 한 부분입니다. 환경이 그에게 [객관적 실재의 한 부분으로] 그렇게 존재하는 것은, 그가 환경을 바로 그렇게 드러내는 방식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단순히 동물적인 삶만을 사는 생물체에게 그가 사는 주변 환경(milieu)은 문제와 기회들의 연쇄에 불과하다고 말할 때, 나는 그 생물체가 자신의 환경을 그러한 용어로 파악한다고 (conceive)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단순한 동물들에게—그 자체로 세계에 대한 지향으로 여겨져야 하는, 개념적으로 매개된 지향을 포함하여—완전한 주관성, 즉 개념적으로 매개된 지향을 귀속시키려는 시도가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해당 개념들을, 사물들이 생물학적 충동과 관계 맺는 방식 덕분에 충족하는 개념들로 제한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지향이 조금이라도 세계에 대한 지향이 되기 위해 요구되는 자유와 거리를 결여한 지향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셈입니다. 단순히 환경 속에서 산다는 것과 세계 속에서 산다는 것 사이의 구분의 요점은, 바로 우리가 단순한 동물들에게 완전한 주관성, 곧 세계에 대한 지향성을—그러한 방식으로 제한된 것으로조차—전혀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환경의 특징들이 지각하는 동물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함의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환경의 특징들은, 내가 말해온 것처럼, 동물에게 문제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요점은 단지 [환경의 특징들이 그 동물에게 문제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이러한 사실을, 그 동물이 그 특징들을 문제나 기회로 파악한다고 말하는 것과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의 특징들이 동물에게 존재하는지에 대한 이러한 담화는 주관성의 개념(notion)에 대한 유사물을, 곧 데카르트적 기계 작용(automatism)이 우리의 그림 속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증하기에 충분히 가까운 유사물을 표현합니다. 확실히 [우리의 그림은 데카르트적 기계 작용을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우리가 동물의 민첩하고 자동적인 삶, 곧 동물이 자신의 환경에 능숙하게 대처하는 정확한 방식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환경의 특징들에 대해 동물이 지닌 민감성(sensitivity, 감성)에 호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혹은 저것에 대한 민감성이라는 개념(notion)을 환경에서 살아간다는 관념의 맥락 속에 둠으로써, 우리는 단순한 동물에게 세계에 대한 지향, 심지어 순전히 행동과 관련된 방식으로 개념화된 것으로서의 세계에 대한 지향조차도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칸트적 구조로부터 얼마나 멀리 있는지를 나타내기 위해,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주관성이라기보다는 원-주관성(proto-subjectivity)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John McDowell, Mind and World,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94, pp. 114-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