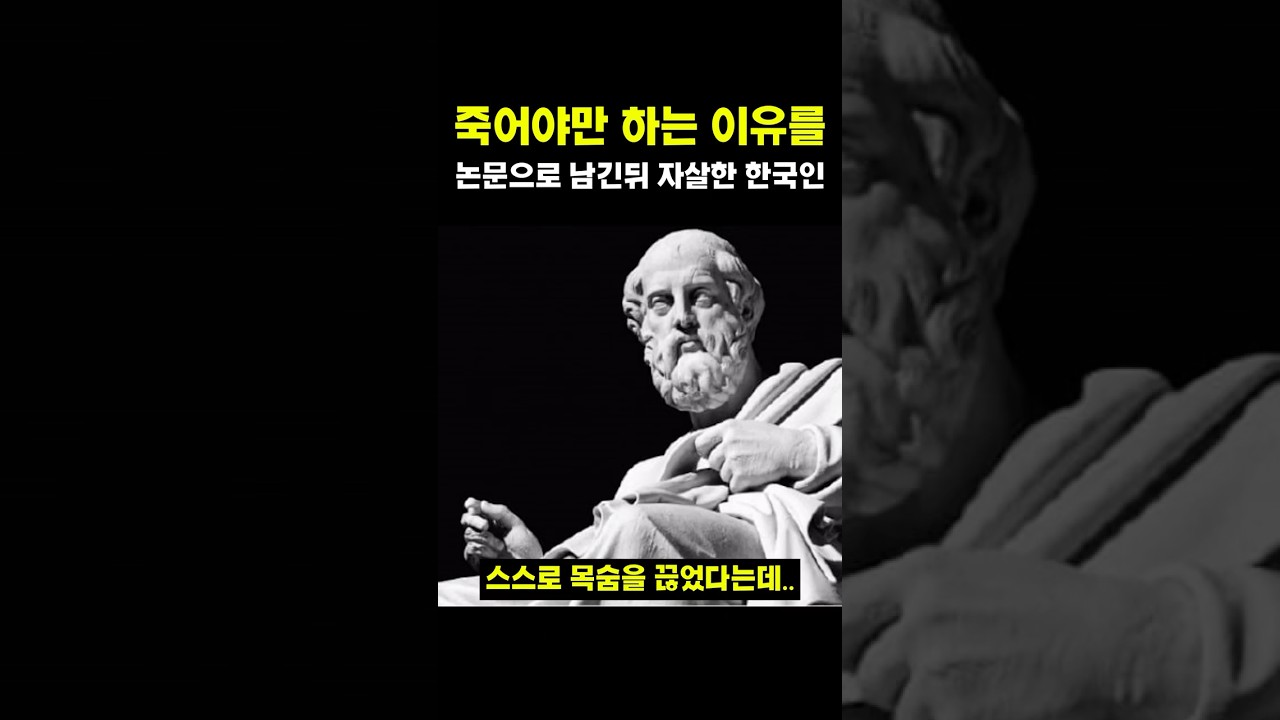자신의 철학을 일관성 있게 지키려 하셨다는 점에서는 존중하지만, 과연 반출생주의가 인생을 걸 만한 사유인지 솔직히 저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 이야기는 잊을 만하면 한 번씩 보는 것 같네요.
참고로 이 사람은 반출생주의를 넘어서 친죽음주의(pro-mortalism)를 지지해서 저런 선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출생주의 자체는 (제가 알기론) 자살 의무를 함축하지 않습니다.
※ 영상 말미에 나오네요 멋쓱;
- 독일의 친죽음주의 철학자 필립 마인랜더가 떠오르네요. 국내에도 저런 철학자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2010년에는 하버드생 미첼 해스먼이 삶의 무의미에 대해 1900장의 원고를 남기고 자살한 적도 있었죠.
이런걸 보면 (살짝 가물가물하지만) 시지프 신화에서 카뮈가 삶을 자살로 몰고갈 논리가 존재하는지 궁금해했던게 떠오릅니다.
- 철학이 갖고있는 심오한? 이미지 덕분인지, 예전에는 철학자들은 다 끝이 자살로 안좋지 않았냐고(...)오해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자살로 끝을 맺었던건 벤야민, 들뢰즈 정도가 생각나네요. 오히려 삶의 고통을 탐구했던 염세주의 철학자인 에밀 시오랑, 쇼펜하우어는 자살하지 않았다는게 살짝 아이러니 합니다.(그렇다고 염세주의 철학자들이 자살했어야 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시오랑은 "우리의 슬픔에 그리도 기꺼이 봉사했던 이 세계를 버린다는 것은 얼마나 무례한 일인가!” 라고 말했다네요.)
- 별개로 베너타의 반출생주의가 본인은 친죽음주의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자살로 귀결되는 논리는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반출생주의가 친죽음주의로 귀결될수밖에 없다는 반론 역시 제기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아래는 프린스턴 대학교의 엘리자베스 하만 교수가 제기하는 의문점 입니다.
Second, Benatar claims that his conclusion does not imply that we shouldall commit suicide. It is easy to see why his First View does not yield thisresult. His First View is that when we are procreating it is irrelevant whatgood experiences the person will have, because there is nothing bad aboutthose good experiences failing to occur. This view about procreation doesnot imply that it is irrelevant what good experiences one would have in thefuture, when one is deciding whether to commit suicide.Benatar points out that his Second View does not, strictly speaking, implythat we should commit suicide. On his view, a life may be so bad that it isnot worth starting but it may be good enough to be worth continuing—because someone who exists may have an interest in continuing to exist.But I think his arguments for the Second View, if successful, do imply thatwe should commit suicide. He does not claim that our lives are in generaljust bad enough to be not worth starting, but not so bad that they are notworth continuing; rather, he argues that our lives are awful. If, in taking intoaccount both the good and bad aspects of our lives, it turns out that our livesare overall very bad, then it seems we would each be better off to commitsuicide. It seems that the kinds of arguments Benatar makes would work aswell, for most of us, if they are just focused on the future. It’s no part of hisview that the good parts of a life tend to be later in the life and the bad partsearlier, so that by killing ourselves we would be losing out on the better parts.Perhaps we have other-directed obligations not to commit suicide. But at leastwhen considering what is best for ourselves, it seems to me that if Benatar’sarguments for his Second View succeed, then we would be better off to killourselves.4(Harman, Elizabeth (2009). David Benatar. Better never to have been: The harm of coming into existen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Noûs 43 (4):784)
(gpt 번역)ChatGPT 두 번째로, 베나타(Benatar)는 자신의 결론이 우리 모두가 자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의 첫 번째 관점(First View)이 이 결과를 낳지 않는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 그의 첫 번째 관점은, 우리가 출산(procreating)을 할 때, 그 사람이 좋은 경험을 할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좋은 경험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출산에 관한 이러한 관점은, 미래에 어떤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을지를 고려하여 자살 여부를 결정할 때는, 그 좋은 경험이 무의미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베나타는 자신의 두 번째 관점(Second View)이 엄밀히 말해 우리가 자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한다. 그의 관점에 따르면, 어떤 삶은 시작할 만큼 가치가 없을 정도로 나쁠 수는 있지만, 이미 존재하는 사람에게는 계속 살아갈 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할 만한 가치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나는 그의 두 번째 관점에 대한 논증이 성공적이라면, 그것은 결국 우리가 자살해야 한다는 결론을 암묵적으로 함의한다고 생각한다. 그는 일반적으로 우리의 삶이 '시작할 정도로는 나쁘지만, 계속할 정도로는 나쁘지 않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우리의 삶이 매우 끔찍하다고 주장한다. 우리의 삶에 있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모두 고려한 결과, 삶 전체가 전반적으로 매우 나쁜 것이라면, 우리는 자살함으로써 더 나은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이 아닌가.베나타가 주장하는 논증들은, 그것이 우리의 미래에만 초점을 맞추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여전히 잘 적용될 수 있는 것 같다. 그의 관점은 삶의 좋은 부분이 대개 나중에, 나쁜 부분이 대개 초기에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니므로, 자살을 통해 더 좋은 부분을 잃게 된다는 식의 주장은 해당되지 않는다. 물론 자살하지 말아야 할 대인적(對人的) 의무가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최소한 우리 자신에게 무엇이 최선인가를 고려할 때, 만약 베나타의 두 번째 관점에 대한 논증이 성공적이라면, 우리 각자가 자살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것이다.
저도 쇼펜하우어와 카뮈가 생각났어요. ㅋㅋㅋ
시지프 신화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 존재론적 이론을 증명하기 위해 목숨을 던지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하고 같은 문단에서 "역설적이게도 자신에게 살아갈 이유를 부여해 주는 이념 혹은 환상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썼더라고요!
반출생주의나 친죽음주의는 이론을 증명하기 위한 죽음인지, 아니면 삶의 이유와 그 양면을 위한 죽음인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