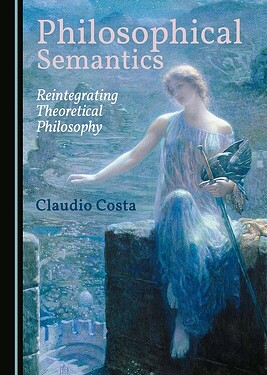저는 '클라우디오 코스타(Claudio Costa)'라는 이름을 아주 최근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투겐트하트의 형식적 의미론을 공부하면서, 그의 의미론을 오늘날에도 여전히 발전시키려는 노력들이 있을지 찾아 보다가, 코스타가 2019년에 출판한 『철학적 의미론』(Philosophical Semantics)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거든요. 이 책에서 코스타는 대단히 독특하고 야심찬 작업을 제시하더라고요. 자신은 프레게, 비트겐슈타인, 스트로슨 등을 통해 전개된 20세기 초중반 언어철학의 '오래된 정통'을 옹호하면서, 그 정통을 바탕으로 크립키, 도넬란, 카플란 등이 제시한 그 이후의 외재주의적이고 인과주의적인 '새로운 정통'을 비판하겠다고 해서요. 특별히, 자신이 서 있는 바로 그 '오래된 정통'의 가장 완성된 형태로 투겐트하트의 형식적 의미론을 지목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다른 주제로 글을 찾다 보니, 이분이 2023년에도 비슷한 기획을 바탕으로 『고유명사는 어떻게 실제로 작동하는가?』(How Do Proper Names Really Work?)라는 책을 출판하였더라고요. 저는 이 책의 제2장 "크립키의 유사-지시주의의 비일관성"(Inconsistencies of Kripke's quasi-referentialism)을 읽어 보았습니다. 일단, 내용에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거나를 떠나서, 이분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동안 제시된 기술주의/지시주의 논쟁과 관련된 내용을 총집결시켜서, 크립키가 기술주의에 대한 반론으로 제시한 양상 논증, 의미론적 논증, 인식 논증을 하나하나 비판하고, 더 나아가 크립키의 입장이 지닌 내적 문제점으로 직접적 지시 이론의 '인과적 연쇄' 개념이 화자의 의도에 대한 기술구 없이 성립할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해서요. 단순히 기술주의/지시주의 논쟁에 의견을 하나 더하겠다는 기획을 넘어서, '오래된 정통'의 관점에서 이 논쟁 자체를 완전히 해부해 버리겠다는 결심을 하고 쓰인 책이더라고요.
코스타는 '인과적 연쇄'라는 개념을 크립키의 직접적 지시 이론의 가장 치명적인 맹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초의 명명식으로부터 고유명사의 의미가 '인과적 연쇄'에 따라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크립키의 주장과 달리, 이 연쇄가 과연 어떤 의미에서 '인과적'이라고 할 수 있는지는 사실 다소 불분명하죠. 인과적 연쇄에 따라 고유명사의 지시체가 무엇인지 안다는 것은, 결국 최초의 명명식을 수행한 사람이 무엇을 지시하고자 하였는지에 대한 '의도'를 그 다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 '의도'에 대한 이해가 다음 사람에게 단순히 인과적으로 주어지지 않고, 그 의도에 대한 '기술구'를 통해서만 주어진다는 것이죠. 따라서 직접적 지시 이론은 자신이 비판한 기술주의를 전제하지 않고서는 결코 자신의 논의에서 핵심이 되는 '인과적 연쇄' 개념을 해명할 수 없다는 것이 코스타의 지적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인과적-역사적 관점은 필연적으로 선결문제 해결의 오류에 빠진다. 비록 그 관점의 목적은 기술주의를 극복하는 것이지만, 그 관점은 설명력을 얻기 위해 기술주의를 특정한 방식으로 전제한다. (Costa, 2023: 3)
개인적으로, 저는 코스타의 주장에 완전히 동의가 되지는 않습니다. 저 역시 해석학을 전공하다 보니, 우리가 아무런 매개 없이 대상을 지칭할 수 있다는 크립키의 직접적 지시 이론에 대해 비판적입니다. 하지만 직접적 지시 이론을 비판하기 위해 다시 한정 기술구 이론 같은 또 다른 이론을 받아 들여야 하는지는 저에게 다소 의문스러워요. (코스타는 자신의 의미론적 입장을 일종의 '클러스터 이론'이라고 규정하고, 자신의 존재론적 입장을 '트롭 이론'으로 규정합니다.) 게다가, 코스타가 의존하고 있는 중요한 철학자인 투겐트하트도 직접적 지시 이론에 대해 완전히 비판적이지만은 않아요. 오히려 투겐트하트는 고유명사가 그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도 지니지 않는다는 크립키의 주장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고유명사의 의미를 기술구로 해명하고자 하는 코스타와는 약간 다른 방향의 길을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코스타의 작업들이 적어도 저에게는 정말 대단하게 느껴지기는 하네요. 제가 언어철학의 테크니컬한 논의들에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20세기 중반부 이후의 언어철학에서 이렇게까지 본격적으로 외재주의와 인과주의를 극복하려는 시도를 하는 인물을 거의 본 적이 없어서요. 심지어 비트겐슈타인계열의 대표적인 철학자들로 잘 알려진 맥도웰이나 브랜덤의 논의에서도 이렇게까지 크립키와 정면 대결하는 논의는 찾아보지 못하였네요. 그 두 사람은 자신들 자체가 워낙 거인들이다 보니, 자기 자신들의 논의를 전개하는 것을 좋아하지 이런 고전적인 논쟁 자체를 치밀하게 분석하지는 않아서요. 오히려 교과서적 언어철학의 맥락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라면, 그리고 그 맥락에서 직접적 지시 이론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 지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코스타가 제시하는 체계가 훨씬 더 잘 와 닿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