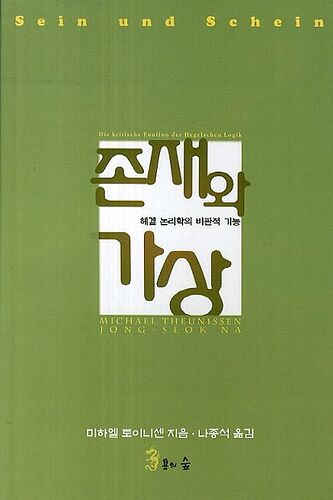헤겔 논리학 연구서로서는 명작의 반열에 오른 토이니센의 『존재와 가상』을 알게 된 지 5년이 넘었습니다. 헤겔 논리학에 대해 무지하던 당시 이 책을 해설서 쯤으로 생각하고 폈다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머리를 싸매고 쩔쩔맸던 기억이 있는데, 5년이 지난 지금 그때와 다를 바 없는 처지에 놓여 있네요. 서론에서 쩔쩔매는지 180페이지 쯤에서 쩔쩔매는지의 차이야 있지만 말입니다. 보통 책은 읽으면 읽을수록 이해도가 높아져서 속도가 붙곤 하는데, 이 책은 읽어도 읽어도 똑같이 어렵습니다. 아니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종종 군데군데 번득이는 아이디어들을 발견하면서 과연 괜히 고전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지도교수님도, 확실히 헤겔 연구에서 중요한 책인데도 불구하고 영어로 번역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아쉬워하셨습니다), 그에 못지않게 막혀서 헤매기 일쑤입니다. 헤겔 논리학에 대한 이차 연구서도 정복하기가 어려운데, 헤겔 논리학은 언제 (정복은 언감생심이고) 온전히 이해나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확인해 보니 제5장의 2절 "순수 직접성의 개념논리적인 재생산" 부분이네요. 해당 구절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제는 일반적인 사물들이 현상인가 존재를 지니는가라기보다는, 『논리의 학』의 맨 처음에 등장하는 순수 존재라는 범주가 어떻게 그보다 훨씬 뒤에 등장하는 범주들에 비추어 이해되고 재구성될 수 있는가입니다. 순수 존재는 그에 대해 어떤 규정이나 정의도 내릴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추상적인 범주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헤겔은 순수 존재에 대해 논의하면서 "무규정적 직접성", "추상적이고 단순한 자기관계"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데, 해당 절에서 토이니센은 그러한 표현들이 사실 해당 책의 제3권에서 등장하는 구체적이고 복잡한 개념들에 의한 순수 존재 범주의 재구성이라고 파악합니다.
그 중 여기서 문제가 되는 표현은 "단순한 자기관계"인데, 슐츠의 제안은 우리가 사물들을 직관적으로 포착하는 방식을 살펴봄으로써 이 표현이 이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사물들에 대해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고 사물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각 사물들은 사소한 의미에서 자기 자신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물들은 단순하게 자기 자신과 관계합니다. 이때 "사물들은 단순하게 자기 자신과 관계한다"라는 진술에서 "사물들"을 제거해버린다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단순히 자기 자신의 관계입니다.
물론 토이니센 자신도 같은 쪽에서 이야기하듯이, 이러한 설명이 "단순한 자기관계"라는 표현을 온전히 해명하지는 못하고, "단순한 자기관계"라는 표현이 논리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