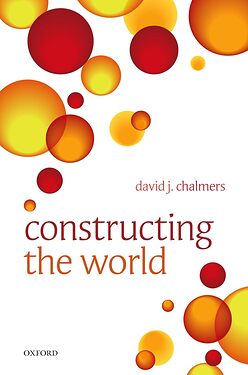차머스(David Chalmers)의 Constructing the World를 읽고 있습니다. 세계 '건축(Aufbau)'이라는 20세기 초반 분석철학의 기획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의미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 책 1장의 내용을 예전에 훑어본 적이 있었었는데, 그때는 서문을 읽지는 않아서 차머스가 정확히 어떤 맥락에서 논의를 전개하는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 차머스는 일종의 카르납주의를 옹호하고 있네요. 자신의 작업을 '카르납적 합리주의(Carnapian rationalism)'라고 명명하면서, 자신은 카르납의 핵심적 아이디어들이 근본적으로는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는 이야기를 하네요.
In many ways, Carnap is the hero of this book. Like the other twentiethcentury logical empiricists, he is often dismissed as a proponent of a failed research program. But I am inclined to think that Carnap was fundamentally right more often than he was fundamentally wrong. I do not think that he was right about everything, but I think that many of his ideas have been underappreciated. So one might see this project, in part, as aiming for a sort of vindication. (Chalmers, 2012: xvii)
차머스가 이런 카르납적 기획으로부터 주류 분석철학의 흐름에 반대되는 여러 가지 입장들(가령, 정신적 내용에 대한 내재주의, 분석/종합 이분법 등)을 제시한다는 점이 인상적이네요. 특별히, 의미에 대한 프레게의 입장을 옹호하려 한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사실, 1980년대 이후 주류 분석철학은 의미에 대한 직접적 지시 이론을 받아들이면서 반프레게주의로 기울었죠. 말하자면, "의미가 지시를 결정한다(Meaning determines reference)."라는 프레게적 논제에 반대하여, "지시가 의미를 결정한다(Reference determines meaning)."라는 크립키적 논제를 많은 철학자들이 받아들이게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차머스는 정반대의 길을 가려 하는 것 같네요.
The scrutability framework tends in a direction contrary to a number of trends in post-1950 philosophy: trends including direct reference theories of meaning, externalism about mental content, and rejection of the analytic/synthetic distinction. In various respects, it helps to support ideas from an earlier era in philosophy. It supports Gottlob Frege’s distinction between sense and reference, and helps provide a concrete account of what Fregean senses are. (Chalmers, 2012: xvii)
My philosophical sensibilities play a role when I consider some of the most famous arguments in recent philosophy: Quine’s arguments against analyticity and the a priori, Kripke’s arguments against Fregean views, Putnam’s and Burge’s arguments against internalism. I use the scrutability framework to rebut some of these famous arguments and to limit the consequences of others, thereby defending key elements of the traditional views (internalism, Fregeanism, belief in the a priori, and so on) against which these arguments are directed. (Chalmers, 2012: xxiii)
카르납의 부활은 오늘날 메타존재론에서 '양화사 변이(quantifier variance)' 이론을 통해 일라이 허쉬(Eli Hirsh) 등에게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대학원 수업을 통해 들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주류 형이상학자들은 콰인의 존재론적 개입 기준을 바탕으로 소위 '존재의 일의성(univocity of being)'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존재가 언어적 틀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이야기될 수 있다는 입장들도 2010년 이후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제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프레게의 부활은, 제 관심 분야의 책들을 찾아 읽다 보면 로버트 브랜덤(Robert Brandom)이나 로버트 한나(Robert Hanna) 등에게서도 종종 우연히 발견하게 되는 주제라 눈길이 가네요. 브랜덤은 Making It Explicit에서 자신의 추론주의의 시초가 프레게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한나는 Kant and the Foundations of Analytic Philosophy에서 프레게적 '내포' 개념을 다시 살려내고자 하니까요.
여하튼, 죽었다고 생각한 철학자들이 이런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면, 확실히 '현대철학'의 역사라는 것은 아직 쉽게 단정짓기 어렵다는 생각이 드네요. 20세기 초반만 해도 형이상학은 다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1950년대 이후에 갑자기 형이상학의 부흥기가 찾아오고, 그 이후에는 다시 또 프레게나 카르납 같은 20세기 초반 철학자들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었으니까 말이에요. 300년쯤 뒤에는 철학의 방향이 결국 어디로 흘러간 것으로 평가될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