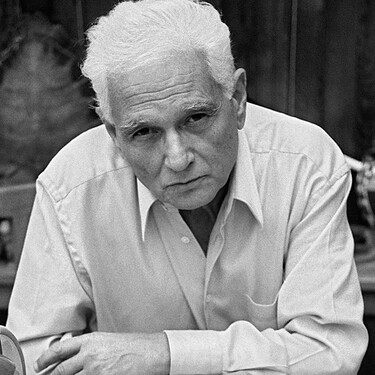들어가는 말
데리다는 소위 ‘철학의 종말(end of philosophy)’이라는 사건이 자신의 시대에 철학자 공동체에서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이러한 현상은 매우 역설적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철학은 철학이 죽었는지에 대해 태생적으로 논의할 수가 없다. (a) 철학이 죽었다고 말하는 논의는 더 이상 ‘철학’이라고 불릴 수가 없고, (b) ‘철학’은 철학이 죽었다고 말하는 논의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즉, “철학이 어제, 헤겔이나 마르크스·니체나 하이데거 이후로 죽었다는 것 […] 또는 철학이 언제나 자신의 죽어가고 있음을 알면서 살아왔다는 것 […] 이러한 모든 점들은 답변할 수 없는 문제들이다. 이러한 점들은 태생적으로 그리고 적어도 한 번은 철학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과제들처럼 철학에 제기되어 온 과제들이다.”(데리다, 2001: 131/Derrida, 2001: 98) 그러나 철학 내부에서 이미 일어나버린 철학의 종말에 대한 물음은, “물음이 유지되어야 한다.”(데리다, 2001: 132/Derrida, 2001: 99)라는 명령에 따라, 물음의 역사로서의 철학(“물음 자체의 힘 또는 모험으로서의 철학”)과 물음의 역사에 대한 물음으로서의 철학(“모험 내에서 규정된 사건 또는 규정된 전환점으로서의 철학”) 사이의 차이를 발생시키면서 오늘날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데리다, 2001: 133/Derrida, 2001: 99 참고)
철학 과 철학에 대한 철학 사이의 차이에 대한 고민 속에서 철학의 전통을 오늘날 새롭게 고찰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철학이 뿌리를 두고 있는 전통으로부터 ‘철학’이라고 불리는 활동이 과연 어떠한 작업이라고 수행하고 있는지를 성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차이에 대한 보다 깊은 사유란, 만일 철학자들이 항상 자신들을 사로잡는 것으로 알고 있는 전통 속에서 어떤 것이 일어날 경우에 그 전통의 기원이 가능한 엄격하게 소환되고 고수되어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닐까? 그것은 어린 시절 요람에 나태하게 웅크리고서 더듬거리기나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와는 정확히 반대이다.”(데리다, 2001: 133-134/Derrida, 2001: 99-100) 바로 여기서 데리다는 그리스적 원천으로부터 철학을 전개하려는 후설-하이데거의 사유와 그리스적 원천을 벗어나려는 레비나스의 사유를 서로 대비시킨다. 두 입장 사이의 대비는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라는 두 기원 사이의 대비로도 묘사된다. 즉,
(1) 후설과 하이데거 는 (비록 세부적으로는 서로 다른 입장을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철학의 전통에 깊이 호소한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전통에의 호소—전통고수주의와는 전혀 무관한—는 후설의 현상학과, 우리가 임시로 근사치와 편리함 때문에 하이데거의 ‘존재론’이라고 부르는 것의 공통된 의도에 의해 표현된다.”(데리다, 2001: 134/Derrida, 2001: 100) 두 인물은 (a) 철학의 역사가 그리스적 원천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보고, (b) 형이상학을 철학이 본래 지닌 그리스적 원천의 왜곡으로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며, (c) 윤리를 형이상학과 분리하여 형이상학보다 더 근본적인 층위와 결부시키려 하는 특징을 지닌다.(데리다, 2001: 134-135/Derrida, 2001: 100 참고) 두 인물의 입장은 철학을 “그리스 전통의 테두리 내에서”(데리다, 2001: 135/Derrida, 2001: 101) 규정하고자 한다. 따라서 철학이란 그리스 전통을 벗어나서는 (그리스 전통으로부터 도출된 (a), (b), (c)라는 세 가지 요인들을 벗어나서는) 애초에 성립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어떠한 철학이건 그 요인들을 뒤흔들려고 할 경우 일단 거기에 복종해야 할 것이고, 혹은 철학적 언어로서 자기 파괴를 하는 것으로 끝나야 한다.”(데리다, 2001: 135/Derrida, 2001: 101)
(2) 레비나스 는 유대 전통으로부터 전혀 다른 사유를 제시한다. 레비나스의 사유가 지닌 놀라운 독창성은 (후설과 하이데거로 대표되는) 기존 철학이 언제나 그리스 전통에 호소하였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는 상황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바로 이러한 심오한 수위에서 에마뉘엘 레비나스의 사유는 우리를 뒤흔들 것이다. 사막 속에 있는, 증폭되는 황무지 속에 있는, 이 사유는, 더 이상 존재와 현상성에 대한 사유이기를 거부하며, 우리로 하여금 탈동기와 소유 폐기의 엄청난 과정을 꿈꾸게 한다.”(데리다, 2001: 135-136/Derrida, 2001: 101) 즉, 레비나스는 (a) 세계를 ‘동일성(the Same)’이나 ‘일자(the One)’의 질서 속에서 안정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그리스적 로고스를 거부하고, (b)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나온 형이상학과는 다른 의미에서의 형이상학을 지향하며, (c) 윤리적 관계에서 초월과 형이상학의 가능성을 발견하고자 한다.(데리다, 2001: 136-137/Derrida, 2001: 101-102 참고)
이러한 레비나스의 사유는 소위 ‘메시아적 종말론(messianic eschatology)’이라고 불리는 토대에 근거한다. 그러나 레비나스가 제시하는 메시아적 종말론이란 결코 철학적 자명성이나, 신학이나, 유대 신비주의나, 교의나, 종교나, 도덕론이나, 히브리 텍스트의 권위에 무비판적으로 의존하지 않는다. 메시아적 종말론은 우리의 경험에 대한 논의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이 종말론은 경험 자체에 의거하여 이해받고자 한다. 경험 자체, 그리고 경험 가운데 가장 환원 불가능한 것, 타자를 향한 여정과 모험the passage and departure toward the other), 환원될 수 없이 가장 다른 것으로서의 타자 자체, 곧 타인(Others)에 의거하여 말이다.”(데리다, 2001: 137/Derrida, 2001: 103) 즉, 레비나스는 단순히 여러 가지 철학적 주제들 중에서 (‘타자’라는) 한 가지 주제를 뽑아내어 ‘메시아적 종말론’이라는 이름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는 모든 종류의 철학에 앞서서 사유 자체를 가능하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경험을 기술하고자 한다. ‘타자’라는 주제가 레비나스에게서 부각되는 이유는 바로 타자에 대한 경험이 (‘동일성’과 ‘일자’라는 개념에 훨씬 앞서는)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경험이기 때문이다. “이 구덩이, 그것은 이런저런 트인 열린 문 가운데 하나가 아니다. 그것은 열림 자체, 개막의 개막이요, 그 어떠한 범주나 전체성에 포함되지 않는 것, 다시 말해 경험적으로 전통적 개념성 내에서 기술될 수 없고, 그 어떠한 철학소(philosopheme)에도 저항하는 모든 것이다.”(데리다, 2001: 137/Derrida, 2001: 103)
데리다는 「폭력과 형이상학」에서 레비나스의 사유가 지닌 의의를 비판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레비나스가 유대 전통으로부터 제시한 사유가, 후설과 하이데거가 그리스 전통으로부터 규정한 철학에 비해, 과연 얼마나 새로울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다.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이라는 이 두 근원의, 이 역사적인 두 언어의 설명과 상호간의 초월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알렉산드리아의 혼성의 나선적 회귀가 아닌 어떤 새로운 비약이, 어떤 이상한 공동체의 출현이 거기서 예고되는가? 하이데거 역시 철학에 기대어 철학의 범위 이하 혹은 이상으로 우리를 데려갈 예전의 언어에 통로를 개설하기를 원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여기서의 이 다른 통로와 이 다른 언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레비나스의 저작을 읽기 위해—아주 부분적으로—선택한 것은 바로 이 의문의 공간이다.”(데리다, 2001: 138/Derrida, 2001: 103)
참고
데리다, 자크., 「폭력과 형이상학: 엠마뉴엘 레비나스의 사유에 관한 에세이」, 『글쓰기와 차이』, 남수인 옮김, 동문선, 2001, 131-246.
Derrida, J., “Violence and Metaphysics: An Essay on the Thought of Emmanuel Levinas,” Writing and Difference, A. Bass (tran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1, 97-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