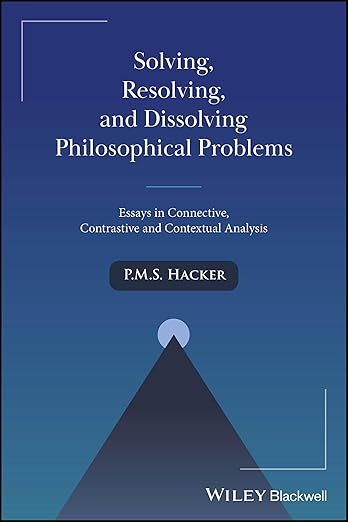비트겐슈타인 연구자로 유명한 해커(P. M. S. Hacker)가 올해 초에 이런 책을 출간했었군요. 다양한 철학적 주제에 대한 해커 본인의 목소리를 담은 책인 것 같지만, '해결(solving)'과 '해소(dissolving)'라는 단어들을 보니 비트겐슈타인적 사고 방식을 그 주제들에 적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에 정답을 제시하여 '해결'하려는 노력보다는, 문제 자체가 사이비적이라는 것을 지적하여 그 문제를 '해소'하려는 전략이 비트겐슈타인적인 사고 방식이니까요. (사족이지만, 어느 '잘못된 청춘 러브코메디'의 주인공이 좋아할 법한 방식이죠.) 다만, 'resolving'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현재로서는 책을 직접 구할 수도 없어서 내용을 알 수도 없고요. 여하튼, 개인적으로는 관심이 가는 제목입니다.
진리에 대한 일종의 다원주의를 옹호하는 책인 것 같네요. 서로 다른 관점과 맥락마다 서로 다른 의미와 진리가 성립한다는 아이디어를 비트겐슈타인의 언어게임, 가족유사성, 규칙 따르기 논의 등에서 발전시키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비트겐슈타인을 언어철학의 맥락에서 이끌어내어 대륙 정치철학과 연결짓는 점이 흥미롭네요!
이런 접근법, 그러니까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이 value pluralism과 연결될 수 있다고 보는 쪽이 학계 주류인가요? 혹은 애초에 비트겐슈타인 논의를 value theory —윤리학이나 정치사회철학—과 연결하는 해석 자체를 거부하기도 하나요?
제가 공부를 하다보면 은근히 이런 방식의 비트겐슈타인 해석을 종종 마주하는데, 이러한 논의가 주류인지 혹은 용납될 수는 있는지 따질 위치가 안돼서 항상 궁금하긴 했거든요.
책을 구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교보문고나 예스24 같은 곳에서 전자책으로 팔고 있기는 합니다!
저도 방금 샀어요
저는 크게 잘못된 논의는 아니라고 봐요. 전기 비트겐슈타인은 '논리적 통사론'이라는 단일한 기준에 따라 의미와 진리값을 평가하려고 한 반면, 후기 비트겐슈타인은 다양한 '문법들'을 바탕으로 의미와 진리값에 대해 이야기하니, 그 논의를 일종의 다원주의적으로 해석할 여지는 있다고 생각해요. 게다가 비트겐슈타인 본인이 윤리에 대해 강조했던 인물이기도 해서, 비트겐슈타인에게서 윤리학적 통찰을 이끌어내려는 시도들도 적지 않고요. (물론, 이런 논의가 반드시 다원주의를 강조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아마도 비트겐슈타인을 대륙 정치사회과학에 연결시킨 거의 최초의 인물 중 한 명은 (혹은 그런 논의를 널리 유통시킨 거의 최초의 인물 중 한 명은) 장 프랑수아 리오타르가 아닌가 해요. 『포스트모던의 조건』이라는 책이 비트겐슈타인의 언어게임 개념을 바탕으로 포스트모더니즘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거든요. 그리고 (저보다 더욱 잘 아시겠지만) 리오타르는 이런 논의로부터 담론 규칙의 보편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쟁론』이라는 책을 쓰기도 했죠. 물론, 리오타르의 비트겐슈타인 독해가 반드시 비트겐슈타인 연구 내부에서 '표준적'이거나 '전형적'인 것인지는 의문스러울 수 있지만, 적어도 이런 논의를 이미 80년대 리오타르 같은 현대 프랑스 철학의 대가들 중 하나도 제시하였을 정도이면, 40년도 더 지난 오늘날에는 비트겐슈타인과 대륙 정치철학 사이의 연결성에 대한 논의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었다고 보아도 좋지 않을까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