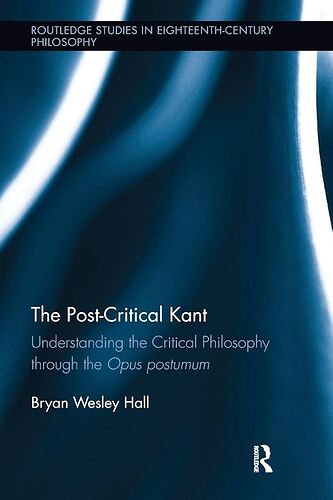"유작"을 중심으로 하는 노년의 칸트에 대한 Bryan Hall의 연구서 『The Post-Critical Kant』를 읽고 있습니다. 칸트가 『판단력비판』이후에 자신의 철학을 어떻게 전개하는지, 도대체 그 "유작"이란 게 어떤 내용인지 너무 궁금해서 읽기 시작했는데,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네요.
제1부에서 저자는 칸트의 비판기 철학에서 아주 문제적인 gap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substance 범주에 대한 딜레마와 관련되는데,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칸트는 『순수이성비판』에서 실체라는 범주를 도입하는데, 문제는 이때 이 substance가 Substance(하나의 실체)인지 substances(실체들)인지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전자일 경우 경험적 대상들의 일반적인—sempiternal and omnipresent—시공간적 형식의 그 단일한 backdrop을 포착할 수는 있지만 대신 상대적으로 지속하는 경험적 대상들을 개체적으로 경험할 수 없고 그들의 변화(alteration)를 지각할 수 없는데, 반대로 후자일 경우 개체적인 경험적 대상들의 변화와 개체성은 지각할 수 있지만 그들 뒤에 숨겨진 단일한 초월론적 배경은 끌어내지 못한다는 건데요, 저자는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경험에 대한 형식적 조건이 아닌 경험의 "질료적" 조건으로서 새 실체 개념이 필요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곧 칸트가 노년기에 도입하는 "에테르"(Ether)입니다.
에테르는 경험적 물질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지만 그들의 속성들은 가지지 않는 것으로, 물리학적으로 실패한 개념인 에테르와는 구분되는 철학적인 개념입니다. (다만 저자는 이것을 "형이상학적"이 아니라 "transcendental"한 것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칸트에 따르면 이것은 단순히 가설적인 개념이 아니라, 경험을 위해서 필연적으로 요청되는 것이라고 "유작"에서 쓰고 있습니다. 저자에 따르면, 비판기 칸트의 초월론적 개념들, 즉 시공간, 범주, 통각은 경험에 '필연적(necessary)'이지만 '충분하지는(sufficient)' 않았다는 것입니다(칸트의 에테르 증명을 요약하자면, 이것은 "우리는 빈 공간을 지각할 수 없다" 또는 "빈 공간은 경험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명제로부터 도출됩니다).
저자는 Westphal, Alison 등의 저명한 칸트 연구자들의 견해를 반박하며 자신의 "유작" 해석을 이어나갑니다. 저자의 목표는 칸트의 "유작"을 다른 저작들과 일관된 프로젝트로 다루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다소 의심스럽다고 할 수밖에 없네요. 제가 보기엔 칸트의 유작은 "판단력비판"의 실패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목적론적 판단력비판에서 칸트가 경험의 통일의 원리를 이념적인 내적 합목적성에서 찾고자 했고, 그것이 결국 한갓 주관적 조건으로만 남게 되었다는, 따라서 이에 대한 실패로서 경험의 통일의 객관적 조건으로서 "에테르"를 도입했다는 견해를 지지합니다. 다만 저자는 이를 프로젝트의 비일관성으로서 거부하는 듯합니다. 또 저자가 반박하는 연구자들의 책을 직접 읽어보지 않아서, 그의 비판이 적절한지도 잘 모르겠지만, 저에게 상당한 통찰력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추가로, 최근에 칸트의 『유작 I.1』을 읽었는데, 그가 죽기 전에 쓴 마지막 유고가 상당히 생각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 유고에서는 "신, 세계,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세계 내의 감성존재자 즉 인간"의 체계를 다룹니다. 즉, 신과 세계를 초월론적 주관에서 통합하려는 시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신, 세계와, 이 둘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는 것"은 『판단력비판』 초월론철학이 라이프니츠-볼프적 초월성으로 약간의 회귀를 겪었음을 보여줄지도 모르겠네요. 칸트는 이어서 "1. 신은 무엇인가?/2. 신은 있는가?"라는 두 가지 물음으로 초월적 신학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그에게서 신은 유일한 인격적 신이며, "오직 하나의 신만이 있을 수 있"으며, 더불어 반대극인 세계란 결코 경험적 세계'들'이 아니며, 이념적 무한성으로 인식되는 "단 하나의 세계"라고 합니다. 전자는 권리만을 갖고 의무는 갖지 않으며, 후자는 둘 모두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은 둘 모두를 가진 존재자로서, 그 둘을 연결하는 매개사가 됩니다. 이러한 초월론철학은 "형이상학의 상위에"위치한 궁극철학, 즉 절대적 철학입니다. (이전에 쓴 요약문을 말투만 바꾼 거라 부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언젠가 이 책과 칸트의 "유작"프로젝트에 대한 비판적 후기를 더 자세하게 남겨보고 싶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